
백한승 Hanseung Baik
박철호의 서사는 완성되었다. 작가는 매우 잘 짜여진 미끼를 던지고, 능수능란하게 둘러치고 메친 후, 마빡을 후려갈긴다. 작가가 고물일을 한다지만 실은 사회의 내장 여기저기를 끊어내고 다녔던 듯 하다. 나의 비장과 당신의 콩팥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선혈이 낭자한 전시장에 뿌려진 검은 피는 작가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서사는 진술이라기보다는 구토에 가깝다. 그리고 그 토사물은 작가의 내장에서 사십여 년 동안이나 묵은 것들이다.
전시의 구조는 단단하고, 그 바탕 위에 구성은 매끈하게 빠져나왔다. 따라오는 메시지는 간결하고, 의미는 유연하게 확장된다. 이는 작가의 단단한 상징들이 곱씹힌 사색에 의해 건져올려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대사를 읊어대는 화자들은 각각 독립체로 병렬지어 있지만, 또한 하나같이 작가를 향해 직렬되어 있다. 다섯 명의 페르소나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수리술술 넘어가지만 사이사이 붉게 녹슨 대못이 씹힌다. 그리고 작가는 관객의 시점을 묶어 고정시킴으로써 이것들이 깡그리 일루전임을 상냥하게 밝힌다. 맞다. 이것은 모두 가상이고 환상이다. 개입할 수 없는 고통만이 농담이 된다.
타인의 고통이 장치에 투사될 때, 관자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 팝콘을 씹는다. 모든 극장은 성소의 구조를 엄격히 따른다. 성소는 믿는 자에게는 지성소를 위한 공간이지만, 전하는 자에게는 성소를 위한 공간이 된다. 지성소에 거하는 법궤가 열리면 성소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가 재미있다고 은막의 뒷편으로 걸어들어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에 주어진 서사의 이면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관자는 작가가 예비한 스펙타클 안으로 들어가 신실한 신도가 되어야만 한다. 관자가 착석하면 불이 꺼지고, 작가는 춤을 추며 피리를 불어대기 시작한다.
작가의 트라우마는 눈알을 뽑고, 수감되어 참회하다가, 노래하며 살해하고, 마시다가 재림하고, 태닝하며 축복하고, 고해하고 자종한다. 작가는 짝을 이루는 모티브들을 교차하여 매복시킴으로써 이야기 전체에 잔상을 중첩시키고,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들을 접점삼아 플롯들을 지탱한다. 박철호가 구축하는 플롯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들이어서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독립된 화자들을 상호변론하게 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메꿔낸다. 이는 부분이 전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작가는 그러한 서사구조를 택함으로써 상징의 유격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생의 굴레로부터 풀려난 조난자의 병편지에 무엇이 쓰였는지 궁금해해서는 안된다. 그 안에는 분명 절절하지만 쌉싸레한 저주가 담겼음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꿈은 혼이 담긴 구라 위에 선다. 우리 모두는 안타고니스트가 프로타고니스트를 괴롭혀야만 한다고 약속했다. 그런 세상에서 안타고니스트의 변명은 스스로가 아닌 프로타고니스트에게만 봉사한다. 어제, 거기의 안타고니스트가 프로타고니스트의 거울로서만 존재했다면, 오늘, 여기의 안타고니스트는 스스로를 위해서만 노래한다. 내가 전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작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전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버려진 것들입니다.”
박철호 2022년 개인전 ‘적대자(서울)’ 리뷰 중
Chulho PARK’s narrative is complete. The artist installs a very well-crafted bait, handles it skillfully, and then rips your mind. Although the artist claims to be in the recycling business, it seems that he actually cut off the internal organs of society. My spleen and your kidneys are all over the place. The black blood that was splattered in the exhibition hall full of blood belongs to the artist. So his narrative is more like vomiting than a statement. And the vomit has been in the author’s intestines for forty years.
The structure of the exhibition is solid, and the composition flows out smoothly on the basis. The message that follows is concise, and the meaning is flexibly extended. This is because the solid symbols of the artist were brought up by thoughtful contemplation. The narrators who constantly recite lines are parallel to each other as an independent entity, but they are also serially directed towards the author. The stories told by the five personas flow smoothly, but rusty red nails are chewed between them. And the artist kindly reveals that these are all illusions by binding and fixing the viewer’s point of view. Right. This is all virtual and fantasy. Only pain that cannot be intervened can be a joke.
As the pain of others is projected onto the device, the audience leans against the backrest and chews the popcorn. All theaters strictly follow the structure of the sanctuary. The sanctuary is a space for the Most Holy to the believer, but to the preacher it is a space for the sanctuary. When the ark of the Holy of Holies was opened, the sanctuary was no longer needed. That’s why we shouldn’t walk behind the silver screen in the theater just because a movie is fun. Therefore, we should not doubt the other side of the narrative given in the exhibition. The spectator must enter the spectacle prepared by the artist and become a faithful believer. Audiences, when seated, the lights go out, and the artist begins to dance and blow the flute.
The trauma of the author is that he plucks out his eyes, is imprisoned and repents, sings and kills, comes back while drinking, tans and blesses, confesses and commits suicide. The artist superimposes afterimages throughout the story by ambush by crossing matching motifs, and supports the plots using the common memories shared by specific generations. The plots that Chulho PARK builds are very personal and are difficult to understand logically, but they fill the narrative in a way that allows independent narrators to argue with each other. This is how the whole describes the part, not the parts build the whole. By adopting such a narrative structure, the artist succeeds in securing a space for symbols.
Don’t wonder what was written in the bottled letter of the survivor, freed from the bondage of life. There is no doubt that it contains a desperate but bitter curse. Dreams stand on the lie containing the soul. We all promised that the antagonist should bully the protagonist. In such a world, the antagonist’s excuses serve only the protagonist, not himself. Yesterday, if the antagonist there existed only as a mirror of the protagonist, today, the antagonist here sings only for himself. When I opened the door to the exhibition hall, the artist said to me: “Everything in this exhibition hall is abandoned.”
Review of Park Chulho’s 2022 solo exhibition ‘Antagonist (Seoul)’

곽영빈 Kwak Yungbin
설익은 감정과 구호를 ‘썸네일’처럼 앞세우는 ‘이슈 파이팅’이나 조급한 기술적 물신주의의 유혹에 스스로를 강매하던 최근의 많은 전시/작업들과 달리, 작가는 AI와 인간, 자연과 인공성, 장애인과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질적인 키워드들을 회화와 영상, 서커스와 키네틱조각 설치를 매개로 마치 오랜 기도 속에 문드러진 묵주처럼 엮어 투박한 듯 정교하게 펼쳐 놓는다.

김남수 Kim Namsoo
우산숲 사이 허공에서 육쪽마늘 스타일 갈퀴손이 육중하게 나타났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그렇게 큰 트럭인 줄 예전엔 실감하지 못했어요. 우악스럽게 움켜잡은 그 갈퀴손에는 마치 매트릭스-환상계를 제조하는 인큐베이터 시스템에서 갓 빠져나온 것 같은 희고 긴 휴머노이드 형태의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어요. 흐느적거리며 허공에서 낭자하게 춤추는 모습이 짠했죠.
빗줄기가 드물지만 그래도 가을장마 뒤끝 작렬하는 스타일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자, 이런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퍼포먼스를 돕는 건지 훼방놓은 건지 첫눈에 분간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재활용품 움켜잡는 갈퀴손이 불쑥 등장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주차한 건물 2층의 난간에 소리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소리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느 마당의 어느 대목인지 몰라서 본의아니게 멍때리기 번외편에 참여한 셈이었지만, 그 소리가 초창기 이선희 쏘는 음색처럼 빗속을 뚫고 귀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심청가! 하고도 인당수 뱃전 대목! 범피중류는 회오리치는 난바다 인당수가 그 한가운데로 배를 몰아가면 의외로 태풍의 눈처럼 고요의 지대가 나타나 물에 빠져죽은 의인들, 가령 굴원이니 오자서니 하는 이들이 심청과 마치 티레시아스 미래 예언처럼 대화하는 대목인데, 이 뱃전 대목은 그런 예언을 받고도 실존적으로 온몸을 인당수 바다에 몸을 던지는/던지기 직전의 대목! 아닌게 아니라 그 사운드스케이프 속에서 희고 긴 형체를 갈퀴손 휘두르는 대로 바닥에 마구 쓸리는 처량맞은 이내 신세 한가지라. 운명지어진 마리오넷처럼.. ㅠㅜ
그리고 아직 ‘아톰’-‘희토’-‘써밋’으로 그 미정형 로봇의 삶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트럭 속에 가득한 반제품 내지는 반폐품에 가까운 원재료가 역시 갈퀴손에 비오는 아스팔트 바닥에 흥건하게 야적되었죠. 어떻게 본다면, 박철호 작가가 조물주의 위상에서 순간적인 조형술로 빚어내는 사이보깅한 생명체는 저처럼 허무하고 의미없는 질료로 되어 있는 셈이죠. 이 물질과 로봇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지만, 아랑곳 없이 대범하게 연결짓는 작가의 무의식은 매우 아나-이매지네이션의 영역이죠.
박철호 2023년 개인전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 (서울)’ 연계공연 ‘성수 인당수’ 리뷰 중

오혁진 Oh Hyukjin
박철호 작가는 앞서 언급했듯 공간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이 말인즉슨 박철호 작가의 작품들은 고립되기보다 전시 공간과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박철호의 세계라 할 것을 펼쳐낸다는 의미다. (…) 오픈스페이스 배의 수직 구조가 배태한 연속 공간.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 가 만화를 기반 한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공간의 연속체는 마치 만화의 칸처럼 인식된다. 왜 하필 만화의 칸인가. 만화의 정의는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이다. 그리고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이 분배되는 공간은 다름 아닌 칸인데, 박철호 작가 역시 이와 같이 자신의 작품을 의도된 순서로 각각의 전시 공간에 배치한다. 달리 말해 해당 전시는 칸과 칸 사이 상상력을 불어넣는 만화의 작업처럼 관객들에게 공간과 공간 사이 박철호 세계로부터 파생된 서사를 채워 넣길 요청한다.
박철호 2023년 개인전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 (부산)’ 리뷰 중

윤은호 Yoon Wn-ho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는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로봇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인간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항상 평가받으며, 결국 필멸자로서 언젠가는 부서지고 말 이야기 속의 로봇들은 자폐스러운 소통방식을 부정당한 채 여전히 사회 주류의 소통방식에 맞추기를 강요받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표상일 수도 있겠다.
박철호 영상 작품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 (2023) 리뷰 중

고동연 Koh Dongyeon
태국 원숭이 인형은 ‘폐품 중의 폐품’이다. 깨끗하지도 않고 표면은 손상되어있다. 물건을 만지고 관심을 지닌 이들의 해석과 염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어서 물건의 이동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쓰임새에 따라 원숭이의 엉덩이 부분이 부서지기도 하고 등에 글씨가 써지기도 한다. 원숭이 인형의 가치를 본 상인 덕택에 인형은 태국의 벼룩시장에서 팔리게 되었고 작가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 와서 전시장에 중요 캐릭터로 포함시켰다. 여기서 쓸모없이 된 폐품이 작가에 의해 발견되고 최소한 개입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은 박철호의 전형적인 창작과정이다.
박철호 2023년 개인전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 (서울)’ 리뷰 중

김남수 Kim Namsoo
“금메달은 도금이다.”라는 말을 접한 유년기의 작가. 표면과 내부 형질 사이의 결렬을 불랙코미디로,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더욱 더 밝은 빛으로 심하게 조명해버리는.
블랙코미디. 부정적인 것을 완곡하게 처리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의지, 이해와 인정을 받으려는 웃음의 촉발. 니체의 선악의 피안에서. 그러면서도 분노가 먼저 전제된 상태에서.
(선악의 피안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인가? 과연. 성악설의 디폴트 아닌가.)
그리하여 기존 ‘릴리전’ 코드의 파국적 장면화 — 신성모독적? 우상파괴적? — 속에서 새로운 ‘컬트’ 태동을 꾀하는 광학적-우주론적 배치. 눈밝은 이여, 그 배치를 읽어라! 멀리서 온 자들에게 작가가 던지는 수행문 혹은 수수께끼. 심각하고 디테일하게! 그리하여 죄의 먼지를 털어주는 은밀한 빛의 구원.
아버지의 폭력과 하나의 눈. 아버지 축으로부터 엄마(=엄마로 생각되는 여성) 축으로 중심이동. 죽은 고라니를 안은 피에타, 케테 콜비츠 스타일로. 그 맞은 편에 ‘우주뱀’을 안은 여성. 동일선상.
박철호 2022년 개인전 ‘유사 종교적 체험을 위한 폐기물들’ 리뷰 중

시유팽 始流澎
“생활이랑 작업이 붙어 있으면 된다.” 이 간단한 말이 지금까지 그의 작가로서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한다. 폐기물 철거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구상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폐기물 속에서 원하는 재료를 찾는다. 현장에서 현장으로 사물을 찾아 이동하는 박철호의 모습은, 공식적 역사에서 누락되어 사라지는 이미지들, 반딧불이의 미광처럼 단속적이고 산발적으로 반짝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미지들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로서의 사진가에 대한 드니 로슈Denis Roche의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공교롭게도 박철호의 예술가로서의 출발점에 사진이 놓여있다.) “(그들은) 한 무리의 빈틈없는 반딧불이들이다. 그 반딧불이들은 산발적으로 조명을 밝히는 데 전념하고,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며 동시대의 탈선된 감성과 이성을 개관한다. 방랑하는 반딧불이의 무언의 찰칵거리는 소리와 찰나의 작은 조명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진 모터가 세심한 시선으로 빛의 영향을 만들 것이고, 찰칵, 빛의 영창, 찰칵, 등등.” (디디-위베르만은 그의 책 《반딧불의 잔존》에서 드니 로슈를 인용하며, 자본주의 스펙터클의 강한 빛에 가려지는 반딧불이의 미광과도 같은 민중의 이미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박철호 2022년 개인전 ‘교란종’ 리뷰 중

김남수 Kim Namsoo
교란하는 것은 ‘컬트’고 그에 의해 교란당하는 것은 ‘릴리전’처럼 보인다. 기독교는 ‘릴리전’이고 나머지 우수마발은 ‘컬트’라는 것이 서구의 가름이다. 불교, 샤머니즘, 기타 물신적 괴물주의가 신전을 파먹으며 ‘릴리전’ 역시 자기조소적 농담 속에 휩싸이는 듯. 하지만 이런 광경에서 두발짝 물러나서 보면 축의 시대[The Axial Age] 어차피 싸가지 읎는 지혜들끼리 마치 두꺼비가 뱀을 삼키고 뱀이 두꺼비를 삼키듯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파노라마 같기도 하다. 중층적인 이런 기나긴 스토리가 벽화 속에 담겨 있어서 좍좍 뜯어내는 꼴라주의 서슬에 무심하게 드러나는 파노라마랄까. 탈식민주의적 시선을 철회하고 본다면. 마치 “밀물에는 물고기가 개미를 먹고 썰물에는 개미가 물고기를 먹는다”는 속담처럼. 그 먹고 먹히는 해학적인 상황극 가운데.. 영화 <사이코>의 해골어머니가 뱀파이어 사슴신을 안은 피에타, 신전 주춧돌과 기단을 장식한 최신/최고의 단청, 이발도구들을 삼켜버리며 증식하는 머리칼 형식의 숲과 몽사[夢蛇], 발 아래 저 마룻바닥 밑의 리바이어던 신세인 동시에 터줏대감 업신[業神] 그리고 자본주의가 버린 그 모든 반폐품을 다시 반제품화하는 넝마주의자 등등 강력하게 재물신화하는 무허가 권능이 발휘되면서 현란할 정도로 먹기 신공의 디테일이 정말 엎치락뒤치락 춤추고 있다. 그런데 이 교란종 소동 속에서 새로 태어나려는 애니믹한 야생종 하나가 지금 마악 어딘가의 환도뼈를 노크하고 있는 듯싶다.
박철호 2022년 개인전 ‘교란종’ 리뷰 중

신현진 Shin Hyunjin
소설 <교란종>의 탁월함은 초능력에 대한 이중적인 은유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신의 초능력(즉, 초자연적인 섭리)을 내세워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을 은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천재적 능력(즉, 초능력)을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한 행동 양식이 내재한 미술가와 미술계를 은유하는 듯하다. 미술가 중에는 자신의 논리 없음을 미술가적 기질이나 천재성으로 포장하는 이들이 흔하니 박철호 작가에게는 미술가들의 모습이 허세로 가득 차 있거나 사이비 교주처럼 자신을 천재성이나 성스러움을 가진 사람으로 행세하며 상식이 아니라 허황한 말들을 늘어놓는 부흥회 목사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장면마다 초능력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 현시대 종교 문제를 풍자했고 여기에 미술 실천의 사례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에게 독자 자신과 미술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했다. 소설의 주요 무대는 이발소, 무당인 할머니 가족의 거주지, 예배와 이벤트가 일어나는 고물 금고가 산더미처럼 쌓인 형상에서 금고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장소인데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미술과 관련된 장면이 함께 스케치 됐다.
박철호 2022년 개인전 ‘교란종’ 리뷰 중

오재우 Oh Jaewoo
돌아보면 그는 세상의 이미지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가 주운 이미지들은 인쇄되거나 출력된 상태로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그 위에 호작질을 하곤 했다. 그는 마치 예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 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그 이미지들 위에 몸을 굴리고, 이미지들 위에 배설물을 문지르는 아이처럼 이미지를 뭉개고 자신만의 기호를 남기곤 했다. 처음의 웅얼거림이 점차 블랙 코미디가 되더니 그에게 세상은 마치 휘발되는 코미디처럼 다뤄졌다. 그는 세상을 우습게 만드는 일을 즐겨 했는데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의 유 머의 유쾌함과 그의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와 쭈뼛쭈뼛하는 태도들에서 어긋난 척추를 가지고 외발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곤 했다. 그의 발자국 뒤에는 비웃음이 땀방울처럼 한 움큼씩 떨어져 있었는데 그 비웃음은 왠지 모 를 시큼한 냄새가 나는 비웃음이었다.
박철호 2022년 개인전 ‘교란종’ 리뷰 중

김남수 Kim Namsoo
박철호 작가의 ‘반대편의 진짜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져 있더라. 해적으로서의 ‘반대편의 진짜 얼굴’. (물론 저 1962년 서부극에는 해적이라곤 나오지 않고, 심지어 애꾸눈도 나오지 않는다.) 그게 보고 싶더라.
해적이란 훨씬 더 잔혹미의 추구자 아닐까. 괴혈 냄새와 럼주냄새와 더불어. 그렇다면,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기준으로 반-폐기품 내지는 반-자연에 가까운 고물의 수거는 해적이 하기에는 가오는 없다. 한국에서 해적당을 창당하면 모를까. 뒤늦게라도/데스페라도.
해적은 땅을 떠난 위인들이다. 유럽의 초기 공법학은 바다 위에 적용되지 않아서 — 바다는 그리드 측량술이 불가능하다, 나쁜 바다! — 교수형은 육지로 압송하여 이루어졌다. 해적당은 마치 바다 위의 교수형 집단 같은 인상으로 나의 망실된 기억으로는 부의 재분배까지 그런 식의 느낌이었다.
극히 오랜만에 맛보는 활극적인 재미의 전시다. 심하게 즐거웠다. 다만 전시의 해적 출몰 안에 ‘반대편의 진짜 얼굴’을 다시 찾아봐야겠다. 물론 그 이동극장의 나무구조물 뒷편에 작가의 아들인지 해적의 자제분인지 모를 미동이 숟가락으로 어떤 동물의 생간을 먹으려는 장면 사진이 걸려 있기사 걸려 있었다.
박철호 2021년 개인전 ‘적대자’ 리뷰 중 영상 작품 ‘캡틴큐: 붉은 바다 여우’ 부분

배우리 Bae Uri
실재계는 그것을 억지로 들춰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바다 쓰레기가 눈앞에 돌아온 것처럼, 박철호 작가는 고물들을 전시장 안으로 들여와 실재계의 포털을 항상 열어 놓는다. 그리고 앞으로 전시장 바깥에서도 포털은 쭉 열릴 예정이다. 작가들을 위한 ‘오브제 구독 서비스’ 같은 걸로 말이다.
박철호 2021년 개인전 ‘적대자’ 서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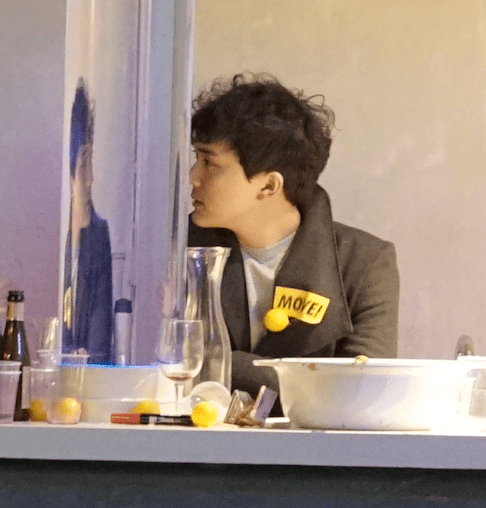
이인복 Lee Inbok
어떤 작업이든 이미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이미지만이 단서로 존재할 때 작가가 가진 내면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번 깨닫습니다. 작가는 그 중심을 감추기 위해 여러 변형을 가함으로써 관객의 탐색을 어렵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으로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 관객을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당매’아는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이정표를 보는 순간 전시는 폭력의 서사 아래 조금씩 섬뜩해져갑니다.
박철호 2020년 개인전 ‘당매’ 서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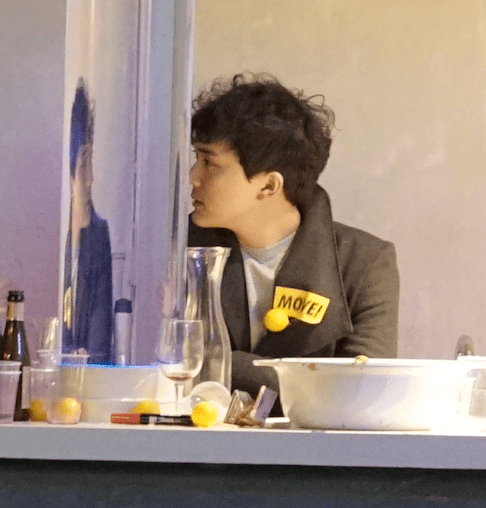
이인복 Lee Inbok
박철호의 작업은 박철호답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관객을 붙잡고 끈덕지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순한 구성을 통해 음식 문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과 허구성을 간단히 드러낸다. 레일 위에서 스팸 통조림을 향해 뛰어드는 돼지, 그 결과 만들어진 가공육과 그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사람의 모습. 탈감정화된 죽음의 모습을 작가 특유의 풍자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실상 식탁의 앞 뒤 과정에 존재하는 폭력성의 무지와 외면은 식탁 위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는다. 그의 또다른 작업인 ‘일체유심조’는 이같은 무지와 외면을 꼬집는다. 두개골 속에 담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대량 학살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먹는 대상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태. 실상 자기 기만에 불과한 탈의심화의 상태에 대해 박철호의 작업은 골똘히 사유하고 응시하게 만든다.
2017년 인디아트홀공 단체전 ‘4번째 공포 :: 식·인 HOMO MANDUCARE’ 서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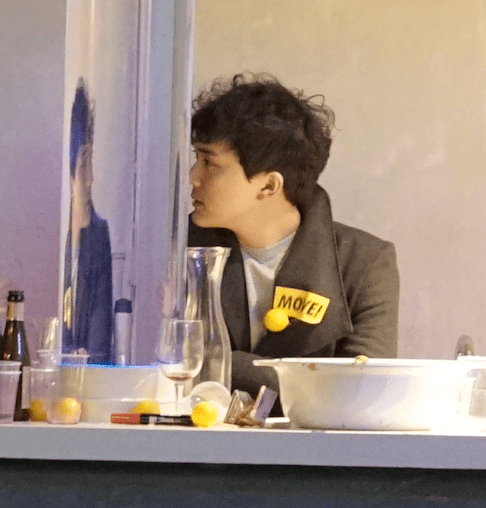
이인복 Lee Inbok
박철호의 작업은 참사에 뒤엉킨 권력관계의 기묘한 형태를 풍자적으로 시각화한다. 침몰한 세월호의 소유주인 유병언은 기업의 회장, 사이비종교의 교주, 그리고 아해라는 예명을 가진 국립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 작가까지 다양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다. 이속에서 작가 박철호는 세월호, 사이비종교, 아해로 표상되는 자본, 종교, 예술이 유병언이라는 하나의 개인으로 접합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작업의 주요 내용은 퍼포먼스를 통해 서술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전시장의 풍경이 이질적인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 전시장의 세 벽면을 가득채운 콜라주 작업들 중 먼저 마주하게 되는 화면은 단순화된 얼굴이 꽉 찬 벽면이다. 세월호의 희생자 수와 동일한 수의 얼굴들. 객관화되고 특징 없은 얼굴들의 연속은 짐짓 공포를 자아내지만 전시의 전체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공포감이 눈, 코, 입의 건조한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보다는 타원형의 얼굴 형태의 보편성이 띄며 관람객과 희생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주관적 슬픔을 관람객에게 환기시킨다. 이는 옆면의 콜라주와 연결되어지는데 그 시각성이 한편으로는 조금은 친숙하다. 작가가 보르도의 전시장까지의 여정에서 현지에서 수집한 작업의 재료들은 기존 작업에서 보이는 포토콜라주의 형식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불어의 나열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로 격화되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지만 상업적 텍스트 사이의 인물들의 얼굴이 일상적 풍경 속에 발생한 사건의 비극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어진 벽면에는 신원불명의 인물 드로잉과 기묘한 형태의 재단, 조악하기 그지없는 장식물까지 유병언과 그의 사이비 종교를 상징하는 다양한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다. 권력 풍자를 업으로 산 말뚝이처럼, 조악하게 양반을 흉내 낸 가면처럼 작가는 자본, 권력, 종교의 허울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유리 피라미드, 세모그룹의CI, 그리고 동시대 자본주의의 피라미드 계급구조가 상징하는 삼각 형태의 수직적 형상은 단순히 우연성에 의한 결합으로 보인다. 허나 작가는 이 수직적 형상을 선회하는 자본의 은폐된 움직임과 욕망에 대한 가볍고 연속적인 접근을 통해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자본의 출현을 보여준다.
2016년 인디아트홀공 단체전 ‘MOVE MOVE MOVE: 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가?’ 서문 중

최광호 Choi Kwangho
전시를 하는 데는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완성된 작품을 보여 준다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시가 있었다. 박철호의 개인전 ‘하다’. 전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밀어닥치는 이미지로부터 자기다움을 찾아 나가는 과정 전체를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5월 20일 5시 30분. 전시장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놀라고 말았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바로 정면에는 날개 형상의 콜라주 작품 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두꺼운 콜라주 작품집이 유리 상자 안에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 전시 공간은 설치된 칸막이로 막혀 있었는데 거 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들이 안의 공간을 향해 뚫려 있었다. 나는 그 구멍 중에 삐딱한 것을 하나 골라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악!” 하 고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안쪽 전시장에는 아무것도 없이 의자와 책상만 놓여 있을 뿐이고, 벽은 하얀 종이로 덮여 있었다. 이 미지는 없고 작가와 작업대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철호(작가)는 종이(포스터, 신문 등)로 만든 옷을 입고 상자 하나 를 들고 나타나, 준비된 책상에 앉아 종이 위에 아이스크림이 5000만 원’이라 쓰고 그 종이를 먹는다. ‘어! 진짜 종이를 먹네!’ 입 안 가득 신 문지를 씹어 먹는다. 전시장에 가득 찬 잡지책들을 종이 분쇄기로 국수같이 만들어 케첩을 뿌려 다시 먹는다. 그러고 일어나 큰 자루 안에 서 잡지며 신문, 포스터 등의 잡다한 쓰레기를 전시 공간에 쏟아 붓는다. 그러고는 관중석 한가운데로 나와 온몸에 풀을 바르고 그 종이 더 미 위를 뒹굴며 몸에 그 이미지를 붙인다. 그런 후 사람들과 서로 돌아가며 안는다. 한참 스스로 생각하다가 벽을 두드리니, 어디선가 다시 소리에 반응하여 계속 소리로 서로 대화하다가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흰 벽 사이로 나오며 벽을 가른다. 와! 그 순간, 흰 막을 걷 어 내니 안에는 이 세상 잡다한 이미지들이 가득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쓰레기로 이곳에서 작업하며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퍼포먼스를 마쳤다. 감동이다. 미친 짓이다.
박철호의 하다! 무엇을 했는가? 지금 이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들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자기는 이 쓰레기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작업하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답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그곳에 갔다.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했고, 응원도 해 주고 싶어서였다. 왜냐면 이러한 전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돈 돈 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주장하기 보다 팔리는 아름다움으로 현혹하는 요즈음 이러한 괴물을 만났으니 반가울 수밖에 ·· 그래서 나는 일주 일을 함께 놀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가 보면 이곳저곳에 자신의 가족 사진들로 그 수많은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옛날 젊은 시절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칠도 하고, 아들까지 데려와 함께 오려 붙이고 칠하며 열심히 스스로에 도취해 놀고 있었다. 어느 날은 나의 스승 육명심 선 생님과 만나 이 전시를 보여 드리기로 했다. 전시장을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미친놈이 아직도 있어?” 하며 안으로 들어가 철호에게 말을 건넨다. 여기에 지지마라” 이 전시는 이렇게 보아야 해 하면서 벌러덩 누워 팔베개하고,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지!~ 하며, 또 우 리 여기서 밥 먹자”고 하며,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이과두주에 자장면 먹으며 예술하며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장 난기가 발동하여 호랑 고함도 치고 벗고 자지도 보여 주기도 하고, 육 선생님은 온몸으로 자기 속내를 몸소 보여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하니, “그래. 오랜만에 좋았어” 하신다.
박철호의 <하다>, 이런 전시는 나는 이 땅에서는 처음 보는 굉장한 것이었다. 우리가 하는 퍼포먼스는 그 순간의 일회성이다. 그런데 박철 호의 하다’는 한순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시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하며, ‘살면서 작업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그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세요’라며 훔쳐보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관음증을 고발하면서, 자기 자신 을 주장하는 것이다.
전시 마지막 날 그 종이옷을 입고 인사동 거리를 나선다. 전시장 안에서만 있기는 답답하여 거리를 활보하며,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정 화시키려고 한다. 전시장도 가고 쌈지길을 가서 활보하는데 그곳에서는 나가라고 한다. 예술로 먹고 사는 그 쌈지도 아직 이런 모험적인 실 형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가 보다. 그래도 박철호는 자기다운 세상을 꿈꾸며 전시장에 돌아와 벽면에 다닥다닥 붙은 것 중에 자기가 좋아 미 음에 드는 부분을 오린 완성품으로 전시장을 다시 디스플레이한다. 그 완성품은 그것으로도 좋다. 이것이 박철호의 <하다> 전시이다.
이 전시는 작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한국 예술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작품은 있어도 작가가 없는 이 시 대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뚝심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젊음 가득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작품들로 두고두 고 내 마음에 남으리라 생각된다. 박철호는 이전에 <요즘 지현이는 섹스를 거부한다>라는 전시로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다. 부인이 임신하 여 관계를 가질 수 없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발설하는 사진들이 기억나듯이, 이번도 역시 박철호다움을 느끼며, 좋은 후배가 생기어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 만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인가 보다. 박철호, 너 자신을 우리에게 듬뿍 보여 주어 고 마워. 작업이 꾸준히 지속되기를 응원한다.
2009년 가나아트스페이스 개인전 ‘DO’ 비평 중